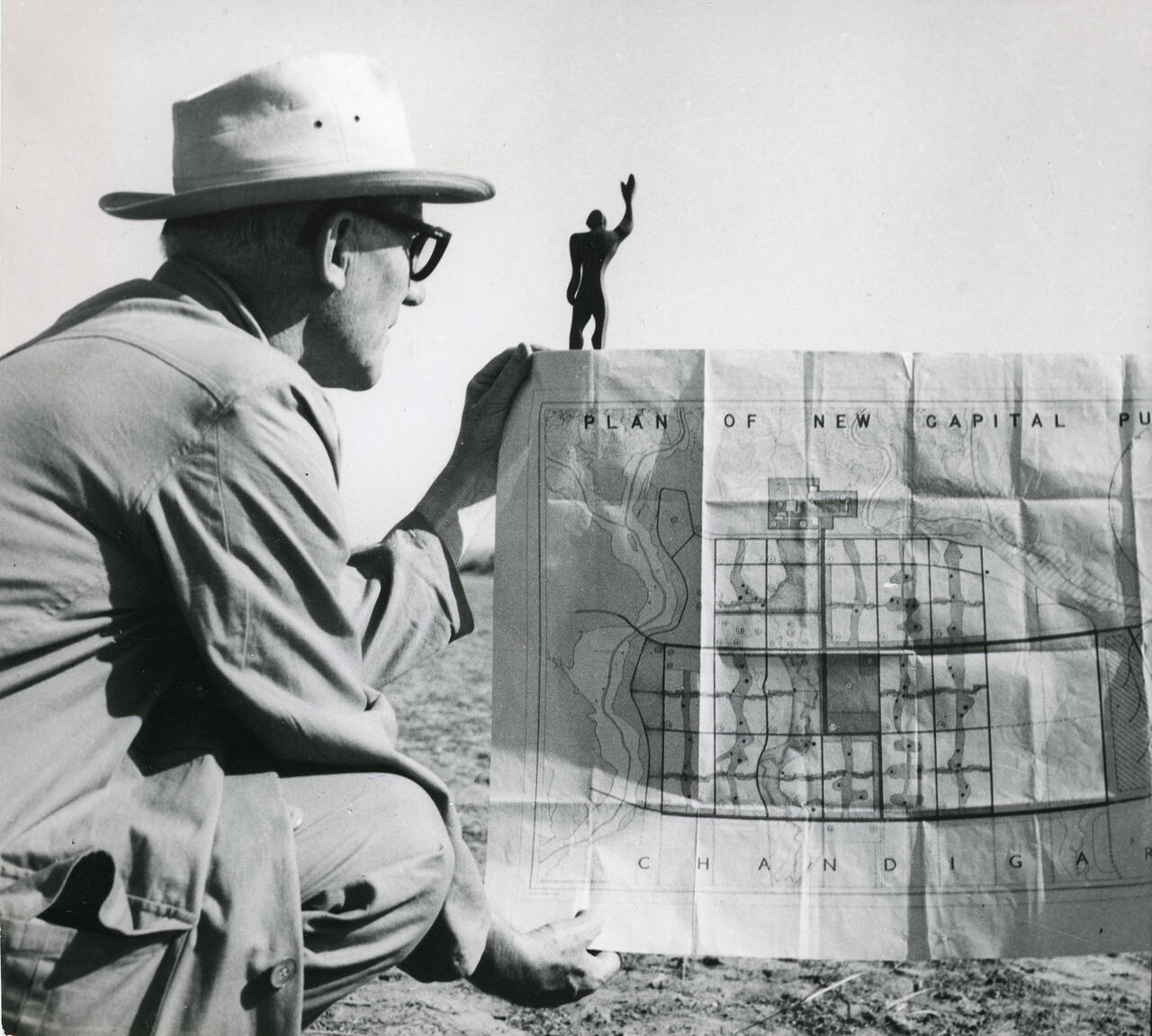디자이너 버질 아블로가 그랬다. 전공이 꼭 길은 아니라고.

처음에 그는 토목공학을 전공했다. 위스콘신-매디슨에서 학사 학위를 받고, 일리노이 공과대학(IIT) 건축학부에 진학해 석사 과정까지 마쳤다.
여기까지만 보면, 패션 디자이너가 왠 건축인가 싶다. 그러나 여러 동료와 교수의 말을 종합해보면, 그는 단순히 건축만 바라보는 학생과는 달랐다.

패션, 그래픽 디자인, 음악 등 항상 많은 분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 건축 수업을 들으면서도 틈틈이 직접 만든 티셔츠를 입고 캠퍼스를 활보했다.
특히 버질이 다녔던 IIT 캠퍼스에는 유명 건축물들이 가득했는데. 대표적으로 ‘S.R. 크라운 홀’이 있다.

특징이라고 하면 내부에 기둥이 거의 없고 공간이 넓게 트였다. 덕분에 시선이 끊기지 않고 한 눈에 담을 수 있다.
이 자유로운 빈 공간을 보고 그는 여백을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다.

‘렘 콜하스’가 설계한 학생 센터 건물도 마찬가지. 건물이 완공될 무렵에 버질은 이렇게 말했다.
“공간에 들어섰을 때 숨이 멎는 기분이었다”

전통적인 건축 질서를 과감히 깨는 디자인이 특징인데. 단순히 보기 좋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가는 방식까지 설계에 녹였다. 버질은 여기서 ‘사람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웠다.

건축물들은 그에게 많은 것을 알려줬다. 공간을 느끼고, 형태를 이해하고, 구조를 해석하는 법까지.
그리고 그 시선은 자연스럽게 패션과 디자인 전반으로 스며들었다.
건축 공부를 모두 마친 그는 곧바로 패션계로 뛰어들었다. 파리에 있는 명품 브랜드에서 인턴을 하고, 자신의 브랜드 오프화이트를 설립하고, 마침내 루이비통 남성복 아트 디렉터가 됐다.

루이비통 21FW 컬렉션에서 그는 ‘도시 스카이라인’을 그래픽으로 담은 숏패딩을 선보였는데.

옷 전체가 하나의 도시 풍경처럼 설계됐다. 파리 노트르담, 퐁피두 센터 같은 랜드마크는 물론 마천루 자체를 3D로 담았다. 도시를 옷 위에 그대로 세운 셈.
건축으로 다져진 시야 덕분에 버질은 옷을 단순히 입는 게 아니라 ‘건축’처럼 바라봤다.
더욱이 그는 모교의 크라운 홀도 자주 찾았는데.

오프화이트와 루이비통 룩북과 화보를 건물 안에서 촬영하기도 했다. 2019년 나이키 협업 때는 크라운 홀 남쪽 계단에 아예 라이트박스를 설치하고 촬영을 진행했다.

훗날 그는 자신의 전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내 뇌가 작동하는 방식은 전부 건축에서 왔다”
그에게 건축은 단순히 백그라운드가 아니었다. 창작의 출발점이자, 어떤 방향으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토대였던 것.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아마 고민이 많을 터이다. 인터넷만 들어가도 ‘전공 살려야 하나?’ 같은 글이 수억 개는 쏟아지니까.
하지만 버질 아블로처럼 생각해보자. 전공을 버리느냐 마느냐의 흑백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다.
학교에서 배운 시선을 믿고, 다른 분야에 펼쳐보는 것. 언젠가는 그 배움이 쓰일 날이 온다.